[칼럼] 성정체성의 성숙은 가족에서 시작된다
젠더 이슈 똑바로 알기 <8>
젠더이론 내지 젠더이데올로기는 남녀라는 성의 생물학적 본질은 무시한다. 그리고 개인이 정하는 남자 또는 여자의 사회적 역할(젠더 역할), 사회적 표현(젠더 표현)을 개인의 정체성(젠더정체성)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어느 가문의 자식이다(가족 정체성).’ ‘나는 ○○학교 학생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직업 정체성).’ ‘나는 중산층이다(계급 정체성).’ ‘나는 한국인이다(민족 정체성).’ ‘나는 기독교인이다(종교 정체성).’ ‘나는 남자(여자)이다(성정체성).’ ‘나는 한 사람의 남편(아내)이다.’ ‘나는 나다(정체성).’ 등.
이쯤 되면 정체성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진다. 정체성은 삶의 기반이다.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정체성은 사람이 태어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으로 시작된다고 본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가족, 친구 관계, 학교, 직장, 국가, 종교 등 성장 단계별로 자연스레 각기 해당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기본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지적인 능력이 성숙할 때 생겨난다.
흔히 어린이가 어떤 고집을 피울 때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순간 정체성에 의문과 불안이 생긴다. 부모의 사랑(돌봄) 또는 거부는 어린아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존재감에 위기를 느끼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된다. 공상이나 여러 행동방식을 통해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해 과하게 자기주장을 하거나 지나치게 순응적으로 된다. 어른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다.
성정체성은 여러 정체성 중 하나다. 성정체성은 어려서 자신의 몸(성기)에 대한 인식과 부모의 인정으로 확립된다. 즉 자신의 몸의 모양을 보고 그것이 아버지와 같은지 어머니와 같은지를 보고, 부모의 인정과 훈육에 따라 ‘나는 아버지 같은 남자구나’ 또는 ‘나는 어머니 같은 여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다. 그리고 자라면서 가족으로부터, 주변 또래들로부터 남자 또는 여자임을 확인받으면서 성정체성이 확고해진다.
이때 불행히도 그가 사회의 규범적인 남자다움 또는 여자다움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변의 지적을 받으면 성정체성 형성에 장애가 온다. “사내가 어찌 그 모양이냐.” “무슨 여자애가.” 같은 말은 트라우마가 되고 정체성 갈등을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가 반대 성의 부모를 흉내내거나 반대 성의 아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기도 한다. 이 상태가 소아의 성정체성 장애(트랜스젠더)이다.
정체성과 관련된 고민 중 가장 큰 고통은 사춘기(청소년기) 때의 성정체성 고민일 것이다.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분비되고, 성욕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차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 어른들은 청소년을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아직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기본적 정체성 갈등과 더불어 성정체성에 위기가 온다.
이때 ‘나는 남자로서 남자답고(여자로서 여성스럽고) 잘 생기고 매력적 존재인가.’ ‘어떤 여자가(남자가) 나를 좋아할까.’ ‘나는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을 한다. 이런 갈등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반대 성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청소년 성정체성 장애(트랜스젠더)의 시작이다. 이것이 성인으로 연장되면 성인 성정체성 장애(트랜스젠더)가 된다.
어려서부터 충분한 사랑으로 개인적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성장한 어린이는 청소년이 됐을 때 성정체성 문제에서도 건강하게 대응해 나간다. 그리고 청년으로 성장해서 이성에게 구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에 골인한다. 이런 사람은 젠더이데올로기에 현혹되지 않는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
[출처] - 국민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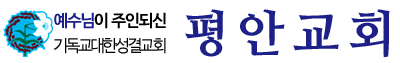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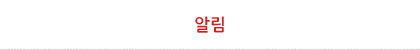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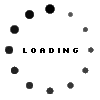
댓글0개